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학교 폭력을 단순한 사건으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고통, 방관자의 책임,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깊숙하게 파고들며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곤 하죠.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학교 폭력 소재 작품들을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시사점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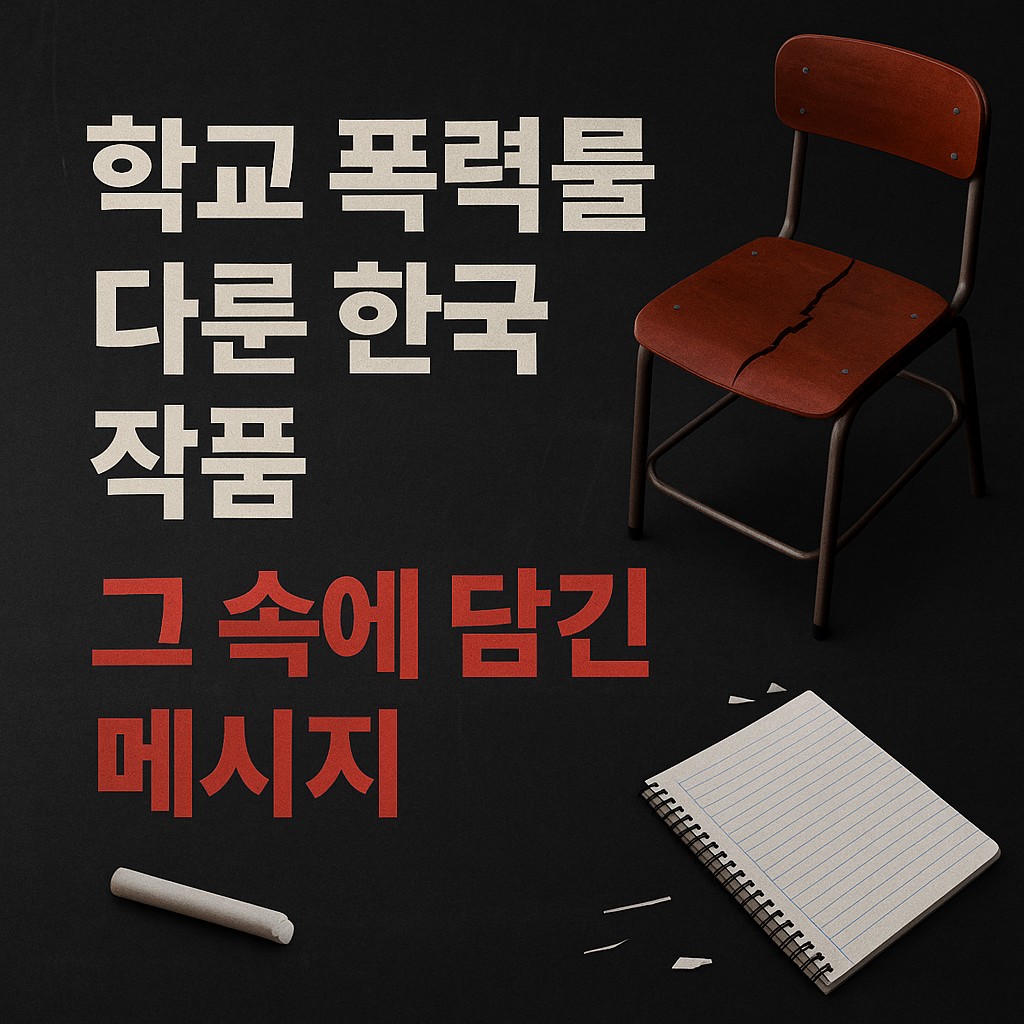
더 글로리 – 복수극 너머 사회 구조를 고발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는 공개 당시부터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학창 시절 끔찍한 폭력을 당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이 교사가 되어 가해자와 방관자들에게 복수하는 서사는 단순히 통쾌한 복수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품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폭력이 교사와 가족, 더 나아가 사회적 무책임 속에서 방치되었음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시청자들이 주목한 건 “피해자는 왜 끝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더 글로리’는 피해자의 시선에 집중하면서도, 폭력을 가능하게 만든 사회적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학교 폭력 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송혜교의 차분하면서도 서늘한 연기, 김은숙 작가 특유의 날카로운 대사가 만나 더욱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켰죠.
한공주와 우아한 거짓말 –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하다
2013년 영화 ‘한공주’는 개봉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인 한공주(천우희)가 전학을 갔지만, 그곳에서도 낙인과 차별, 2차 피해를 겪는 과정은 보는 이들을 숨 막히게 했습니다. 이 작품은 학교 폭력이 단순히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외면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후 개봉한 ‘우아한 거짓말’ 역시 비슷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딸을 잃은 가족이 남겨진 단서를 따라가며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사라진 뒤에야 사회가 반응한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무겁고 불편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한공주’에서 천우희가 보여준 섬세한 연기는 관객들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실감 나게 전달했고, ‘우아한 거짓말’은 남겨진 이들의 시선에서 폭력을 바라보게 하며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피라미드 게임과 싸움의 기술 – 집단과 폭력의 역학을 드러내다
최근 공개된 티빙 시리즈 ‘피라미드 게임’은 학교 폭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인기 투표로 서열이 매겨지고, 꼴등이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설정은 현실보다 더 극단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충격을 줍니다. 특히 집단적 폭력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방관이 어떻게 또 다른 가해로 이어지는지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2006년 영화 ‘싸움의 기술’은 유머와 풍자를 가미해 폭력의 악순환을 그립니다. 학교에서 늘 맞고 사는 약자가 싸움을 배우면서 오히려 또 다른 폭력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씁쓸함을 남깁니다. 두 작품은 서로 다른 톤을 사용하지만, 공통적으로 학교 폭력이 단순히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집단의 권력 구조’ 속에서 재생산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폭력은 사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
학교 폭력을 다룬 한국 작품들은 피해자의 아픔을 중심에 두면서도, 단순한 사건 재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지, 가해자는 어떻게 당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방관자는 왜 침묵했는지를 집요하게 묻습니다. ‘더 글로리’의 복수극, ‘한공주’와 ‘우아한 거짓말’의 피해자 서사, ‘피라미드 게임’과 ‘싸움의 기술’의 집단성 탐구는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학교 폭력은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꾸준히 등장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는 방증일지도 모릅니다.